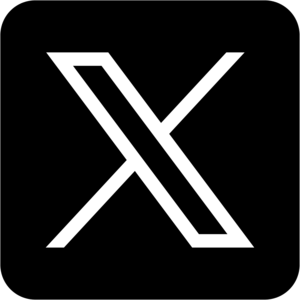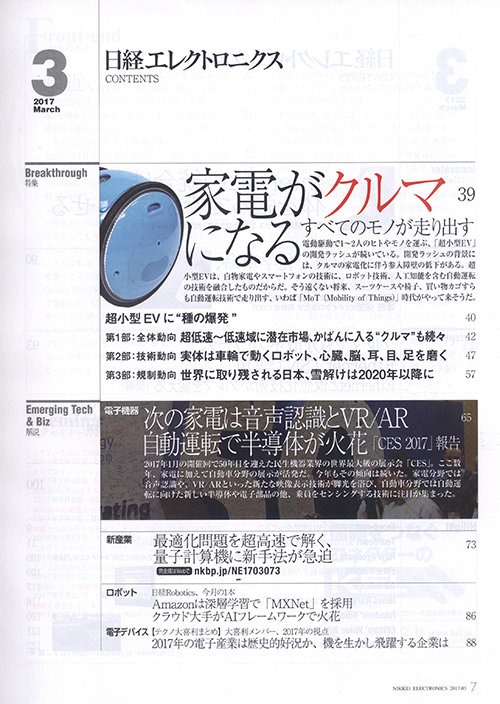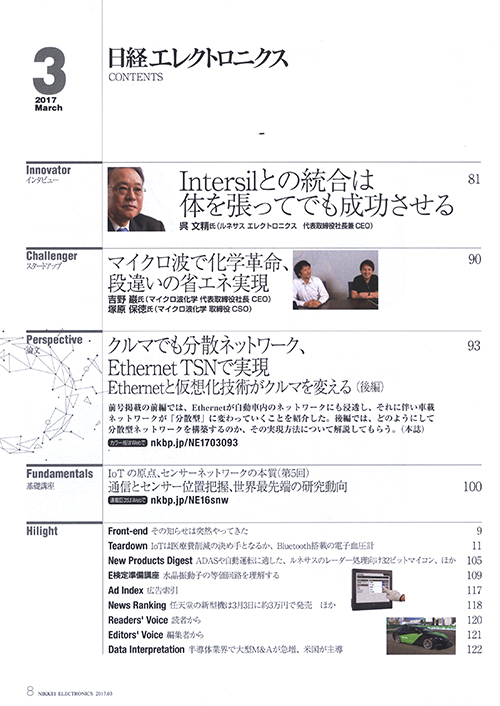일경 일렉트로닉스_2017/03_가전이 이동수단이 된다
Nikkei Electroincs요약
Nikkei Electronics_2017.3 특집(p39~60)
가전이 이동수단이 된다
모든 것이 달리기 시작한다
초소형 EV에 “종(種)의 폭발” -- 사람이 타고, 사람과 물건을 옮기고, 물건을 옮기는
전동구동으로 1~2명의 사람이나 사물을 운반하는「초소형 EV」에 있어서 “종(다양성)의 폭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폭발적인 개발 러시(Rush)가 시작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규제로 인해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는 제품 및 시작품이 많으나, 개발에 대한 강한 집념이 그런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는 모양새이다. 형상, 타는 방법, 기능과 사용법 등이 상당히 다양하여 기존의 탈것의 개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이 30km/h의 속도로 사람과의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1부. 전체동향 편
초(超)저속~저속 단계에 잠재 시장, 가방 속에 들어가는 “탈 것”도 속속 등장
초소형 EV의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배경에는 탈것에 대한 가전화(家電化)로 인해 신규참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있다. 백색가전 및 스마트폰의 기술에 로봇기술, 인공 지능을 포함한 자율주행의 기술을 융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캐리어나 의자, 쇼핑백 까지도 자율주행 기술로 달리기 시작하는, 말하자면「MoT(Mobility of Things)」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 및 사물의 이동을 저속/초저속으로 실현하는 1~2명용의 초소형 전기자동차(EV)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EV기술의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시장은 아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 시장 선점을 위해 여러 업체가 다양한 제품의 제작을 시작했다.
-- “사람과 공존하는 EV” 실현 --
자율주행 EV는 (1)모터 및 그 전원기술, (2)3차원 공간 파악 및 자세 제어 등의 로봇기술, (3)통신 및 센서 등의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4)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여 실현한다. 일반적인 EV는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고속도로 등,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입이 안 되는 도로에서의 실용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술적으로 비교적 구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행 속도는 고속이지만, 교차점이 없으며 EV가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 도로 자체 및 주위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량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주행속도가 30km/h~80km/h인 일반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의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사람이 뛰어 나올 위험이 있는데다가 빈번하게 신호 및 교차점이 있으며, 더욱이 이동 속도가 크게 다른 자전거 및 소형 오토바이 등이 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30km/h 이하의 저속/ 초저속에서는 데이터 처리의 응답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도 함께 낮아진다. 걸어가는 사람을 자동차에 인식시켜 자율주행 EV의 각종 기술을 응용한다면, 생활도로 및 보도 위에서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자전거보다도 안전한 초소형 EV가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자율주행 EV 및 오토바이 업체는 이 잠재시장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요타(Toyota)자동차, 혼다(Honda) 및 닛산(Nissan)자동차, 한국의 현대 모터스, 이탈리아의 푸조(Peugeot) 등이 있다.
-- 민생품 영역에서 경쟁한다 --
더불어, 파나소닉(Panasinic)을 시작으로, 민생품 업체 및 통신 소프트웨어의 룩셈부르크 Skype Technologies사의 창업멤버가 일으킨 기업, 또는 제품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벤처기업 등도 모두 이 잠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코코아 모터스(COCOA MOTORS)와 같은 무게 2.8kg으로 노트북과 같은 모양의「가방 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차량」을 2017년 9월에 출하예정인 벤처기업도 등장했다(제 2부「실체는 차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 -- 심장, 뇌, 귀, 눈, 다리의 기술력을 올리다」참조).
자율주행 EV의 실현에 필요한 상기의 (1)~(4)의 기술은 본래 민생품 업체 및 정보통신 기업이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다. 저속/ 초저속의 최소형EV 이라면, 참여 장벽이 높은 자동차의 기존 시장과는 다르게 민생품 영역에서 경합할 수 있다. 또한 민생품 제조업체만의 (5)소형ㆍ경량화 및 고밀도 실장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도 더해진다.
-- Segway의 카피 상품이 ”가격 파괴“ --
그 선구역할을 한 민생품 중에서 이미 몇몇의 제품은 출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iRobot사의 로봇 청소기「Roomba」시리즈이다. iRobot사에 따르면 Roomba는 세계에서 판매누계 1,500만대 이상으로, 일본에서만 200만대 넘게 판매되었다고 한다. Roomba 자체에는 사람이 타지 못하지만, 로봇 청소기로 실용화가 진화한 장애물 및 인도와 차도간의 높낮이의 검지 기술, 지도를 작성한 SLAM기술을 실장 함으로써 사람이나 짐을 태워 운반하는 초소형 EV를 실현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미국Segway사의 이륜차「Segway Personal Transportation(PT)」에 대표되는「자이 로봇」으로 불리는 제품군은 현재, 저속/ 초저속의 초소형 EV시장을 견인하는 제품의 장르가 되어 있다. 자이로봇은 자이로 센서로 자세제어 및 주행을 제어하는 초소형 EV의 총칭으로써, 이미 업체 수는 50개사 이상 있다. 현재는 공공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에서 상당 수의 제품이 팔리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연간 18억달러(약 2,000억엔), 연간 수 백만~1,000만대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Segway PT자체는 2001년 발매 이후, 약 16년간 합계 10만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 가격이 한 대당 약 100만엔을 넘는 고가였던 점과 세계 각국에서의 규제가 엄격했던 점 등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최근의 자이로봇은 저렴한 것은 2만엔대부터 있으며 가격파괴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 책상의 좌석에 앉은 체로 이동이 가능 --
-- 이동 및 운반 상의 과제들 해결 --
-- 자동차 이용의 70% 대체가능 --
--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 완화가 중요 --
제2부. 기술동향 편
실체는 차륜으로 움직이는 로봇 -- 심장, 뇌, 귀, 눈, 다리의 기술력을 높이다
저속 / 초저속의 초소형 전기자동차(EV)는 차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과 닮은 로봇에 가깝다. 자율주행의 인공지능은 ”뇌”, 전원은 ”심장”, 자세 제어의 자이로/가속도 센서는 “귀 안의 삼반규관(semicircular canal)”, 레이저 센서 및 스테레오 카메라는 “눈”, 모터 및 차륜은 “다리”에 해당한다. 각 업체는 자체적으로 강점을 살려 각자 특징 있는 “EV”를 개발하고 있다.
저속/ 초저속의 초소형 EV는 고속도로 등을 겨냥한 개발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자율주행 EV와는 개발의 포인트 및 구현해야 할 기능이 서로 크게 다르다. 초소형 EV는 사람이 오고 가는 생활 도로 및 보도, 한층 더 나아가 실내에서의 주행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소형 EV용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설정된 루트를 지나면서 자립적으로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또한 특정의 인물을 추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의 장착도 요구되고 있다.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수의 센서 대부분은 인간의 오감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응답 속도도 100㎐정도로 인간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센서 및 부품ㆍ부재도 반드시 초고성능이 아닌, 민생품으로부터의 유용(流用)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저속/ 초저속 초소형 EV 개발에 자동차 업체가 아닌 민생품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참여의 여지가 생기고 있다.
-- “심장”은 백색가전의 기술, “뇌”는 정보처리 기술로 실현 --
파나소닉(Panasonic)도 이 참여에 동참하려는 업체 중 하나이다. 파나소닉은 자율주행의 시험을 반복해서 시행하기 위해 요코하마(横浜)시에 있는 당사의 기숙사를 주행 시험장으로 변신시켰다. 우선은 2015년 10월에 주로 생활도로에서의 20k~30km/h의 저속 주행을 상정한 2인 탑승용 소형EV의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 3월에는 1차 시작기(試作機)를 완성시켰다.
대학의 연구소가 소형차를 개발할 경우, 시판의 자동차를 구입해 차체 등을 그대로 남겨두고 내부만을 개조하는 형태가 많으나, 파나소닉은 이번 시험에서 차체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또한, 도로의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여 정차 중의 차량을 피하거나 교통신호 및 보행자를 인식하여 설정된 루트를 자율 주행하는 기능, 자동 주차 기능 등도 대부분 갖추었다고 한다.
--「자동차 업체는 되지 않는다」--
-- 에어컨 및 세탁기 기술을 응용 --
-- “귀”에는 모션 센서, 흔들림을 상쇄시키는데 이용 --
파나소닉은 이 자율주행의 최소형 EV와는 별도로, “귀의 삼반규관”에 해당하는「로봇용 모션 센싱 유닛(Motion Sensing Unit)」을 개발했다. 3축 자이로 센서와 3축 가속도 센서,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MCU)를 통합한 패키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로봇은 주로 무인반송차(AGV)를 가리킨다. 평탄하지 않은 노면을 달릴 경우의 차체의 흔들림을 이 모션 센서로 검지하여 그 흔들림을 상쇄시키는 제어에 의해 짐받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달리게 할 수 있다. LiDAR만으로는 모션 센서의 대체품이 될 수 없다」(파나소닉). 흔들림을 없애는 것 외에도, 직진 주행 시에 옆에서 부는 바람 등의 방해를 받는 경우, 진행 방향을 유지하는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
-- 자이로 센서에 브레이크 접속 --
-- 일본업체가 제작한 센서 신뢰 --
-- “눈”은 카메라 또는 LiDAR, 민생품과 차재용 센서가 대결 --
최소형 EV 또는 로봇의 “눈”으로 사용되는 센서는 크게 2종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광학 카메라가 기본인 심도(深度) 카메라 또는 스테레오 카메라. 다른 하나는 주로 레이저 빔을 쏘아 주위의 공간을 파악하는 LiDAR로 불리는 센서이다. 저속 / 초저속의 초소형 EV는 스테레오 카메라파(派)와 LiDAR파(派)의 업체, 쌍방을 겸용하는 업체로 선택의 폭이 나눠져 있다.
LiDAR의 대부분은 레이저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m 떨어진 대상도 거리 측정이 가능하여 시야의 각도도 거리에 상관없이 180~360도로 넓다. 측정거리의 오차도 수cm로 작아, 고속도로용 자율주행에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 있다. 또한, 사실상의 업계 표준 제품인 미국 Velodyne LiDAR사의 제품은 약 300만엔으로 상당히 고가이다.
한편, 스테레오 카메라 등은 가격이 수 만엔 대부터 있어 비교적 저렴하며 민생품에서도 이용 사례가 많지만, 측정 가능한 거리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5~20m 정도로 짧다. 또한, 측정 거리와 시야 각도는 Trade-off가 된다. 오차도 멀수록 커지며 수십cm 이상의 오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 고속으로 접근하는 반대편 차량이 과제 --
-- 눈 앞의 사람이나 짐받이를 따라가다 --
-- 추적미사일처럼 추적 --
-- 사람을 잃어버려도 추적 가능 --
-- “발”이 큰 폭으로 소형화, 초경량의 캐터필러도 출현 --
초소형 EV, 또는 이동하는 로봇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리”역할을 하는 차륜(바퀴)이다. 현 시점에서 이족보행(二足步行) 타입의 로봇은 사람과 사물을 운반하기에는 실용 수준이이 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차륜을 기술 혁신으로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이 코코아(Cocoa) 모터스의「WalkCar(워크카)」와 같은 초소형ㆍ초경량의 자이로봇이다. 크기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 차륜의 기술혁명으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 코코아(Cocoa) 모터스의「WALKCAR」와 같은 초소형ㆍ초경량의 자이로봇이다. 크기는 노트북 사이즈로 무게도 2.8kg으로 가벼워「가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코코아 모터스)으로 불린다. 실제로 발매된다면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코아 모터스는 이미 예약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 본 지(誌)의 문의에 대해서는「개발에 전념하고 싶다」라고 답해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 In-wheel motor로 실현 가능할까? --
-- 전차 타입 로봇에서 사람이나 짐을 위한 EV로 --
● 메커니컬 제어 중심의 혼다 VS 소프트 제어 중시의 Segway
초소형 EV의 차륜부분은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실은 설계 및 제어기술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상징적인 것이 혼다(Honda)의「UNI-CUB β」와 Segway사의「Segway PT」 등이 있다. 어느 쪽도 자이로 센서로 자세 및 주행을 제어하는 자이로봇으로써, 조작성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차륜과 그 제어기술은 크게 다르다. 그 조작법의 일부를 혼다가 자동차의 메커니컬(기계적) 제어기술의 범위에서 구현한 것에 비해, Segway사는 소프트웨어 제어만으로 구현하고 있다.
제3부. 규제동향 편
세계로부터 뒤처진 일본, 규제가 풀리는 것은 2020년 이후
대형 자동차에서 가전업체, 그리고 IT기업까지 모두가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자동차(EV)이지만, 일본에서의 시장 성장에는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포함한 공공도로에서 이런 전동차량의 주행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공도로에서 Segway PT에 탄 사람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 3부에서는 일본과 해외의 규제 차이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 소개하겠다.
「도대체 언제쯤 공공도로에서 탈 수 있는가?」「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보는가?」---. 다수의 초소형 전기자동차(EV) 업체의 관계자는 일본의 초소형 EV에 대한 도로 및 차량의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Segway PT 등의 자이로봇은 보도를 포함한 공공도로에서의 승차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초소형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3~4륜의 소형 자동차 타입의 EV 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상당히 한정시키고 있다.
-- 실증실험의 지역은 증가한다 --
도로규제 및 차량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다. 2006년에 쯔쿠바(筑波)시에서 Segway PT 등 몇 가지 자이로봇의 실증실험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토요타(豊田)시에서도 개시. 2015년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의 승인 등의 조건부로 보도에서의 자이로봇의 주행을 허가했다. 2016년 11월에는 경제산업성이 기존의 그레이 Zone이었던 자동기가 부착된 손수레를 보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허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 --
그러나,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규제완화, 또는 너무 느린 대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일본에서 개인이 자이로봇을 공공도로에서 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 중 하나는 이용을 위한 조건이 최소형 EV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에서 자이로봇을 타려면 지방 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의 허가를 받은 후, 10km/h 이하의 속도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보안원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방해했던 적기법과 같다」(어느 초소형 EV 업체)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내각부의 제안도「안전」을 이유로 거부 --
-- 「자율주행 시대에 역 주행」하는 일본 업체 --
● 자율주행 시대에는 Zone(구역)제도로 안전성을 확보
자율주행 EV의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교통 안전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하나로써, 어느 초소형 EV업체가 제안하는 것이 GPS 등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Zone 제도의 도입이다. 보도, 생활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용도에 따라 도로에 최고 속도를 설정하여 EV에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Zone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전부터 존재했다. 예를 들어 통학로에서는「스쿨 존」을 정해, 30km/h이나 그 이하의 최고시속이 설정되어 표식이나 노면 등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강제성을 띄지 않으며, 단속도 적어 효과는 한정적이다. 유럽에서도「Zone 30」이라는 30km/h 이하의 존(Zone)이 생활도로에 설정되어 있으나, 역시 강제성이 없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존(Zone) 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생활도로 둥에서는 도로를 10cm 전후의 쌓아 올려서 스피드를 제어하는「Hump」또는「Bump」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Bump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다. 그 하나는 거주인의 자동차 및 구급차 등 모든 자동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동차 쪽에서 본 Bump는 스피드를 줄여서 지나가더라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으며,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서 Bump 설치 영역을 넓히는 것은 공사비가 방대해 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강제성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그 실현 비용, 편리성 등 간에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면 최저비용으로 실현 가능 --
이것에 대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Zone제도는 앞에서 말한 우려가 거의 없다. EV에 Zone 마다 최고속도 이상의 스피드를 내지 않는 사양을 의무화 시키면 된다. Zone은 디지털 지도상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은 제로이다. Bump의 충격도 없으며 통학 시간 등의 시간대에 따른 속도 규제의 변경도 용이하다. 구급차 등의 긴급 차량은 예외 취급을 하면 된다. 저속/ 초저속의 초소형 EV 중에는 실내에서도 Zone제도에 준한 안전성 확보 기술을 장착한 제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사용이 안 될 이유가 없다.
-- 끝 --
목차